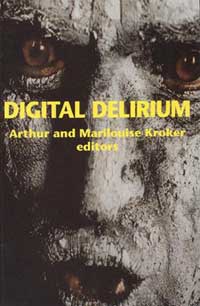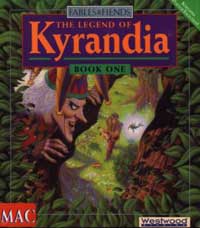최근 온라인에서의 음악 파일 교환이 음반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하바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7주 동안 사람들이 다운받는 175만 건의 음악파일들을 추적 분석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이 실제 음반시장에서는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연구한 결과, 실제로 온라인 음악교환이 음반판매량 저조에 미친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와 실제 음반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