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글을 쓰기에는 아직 뭔가 논의가 부족한거 같다는 생각에 쉽게 “좌담”이라는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좌담이 쉬운것은 아니더군요. 좌담이라기보다는 수다식으로 몇몇이 모여서 떠들어 보았습니다.
웹은 여성주의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혹은 여성주의는 웹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그리고 웹에서의 소통 방식 혹은 웹 자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여기에서는 웹이 훌륭한 대화의 창구, 공론화의 장, 그리고 아젠다 확산의 발판으로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여성주의적 소통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선유도 공원에 다녀왔다. 기분이 좋아 뛰어다니는 아이를 카메라로 찍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총동원하여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여러 장 찍었다. 나뿐 아니라 공원 여기저기가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의자에 비스듬히 눕거나 연인과 포즈를 취한 ‘설정샷’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진 풍경이다. 이렇게 찍힌 사진들은 오늘이나 내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라갈 것이다. 나도 짬이 되는대로 이번 외출에 대해 포스팅을 할 것이다. 특히 동영상은 내가 좋아하는 소재이다. 글보다 쉽고, 그림보다 생생하고, 무엇보다 소박한 연출자가 되어 찍어 올리는 재미가 있다. 이른바 UCC다.
요즘 “네이버 플레쉬/동영상 광고 차단”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글의 원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시판, 댓글,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복사되어 확산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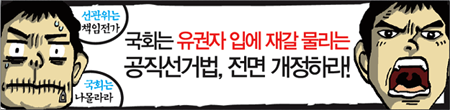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UCC라는 영어 약자를 풀자면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인데 이를 우리말로 바뀐 경우로는 ‘손수제작물’이 있다. 워낙에 텍스트나 이미지는 많이 그래 왔는데, 현재의 UCC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디오 콘텐츠를 주로 말하는 것이어서 UCC라고만 말해도 비디오 혹은 동영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에서도 비디오를 주요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기 위해 ‘손수 영상제작물’이라고 하려 했으나, 워낙에 UCC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UCC라고 하지 않으면 딴 얘기하는 것 같아, 대안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냥 UCC라고 할 참이다.
#newsImg {
width: 450px;
}
#newsWrap {
margin:0;
position:relative;
width: 450px;
height: 450px;
background: url(http://webzine.jinbo.net/img/news_img/news_0915.png) no-repeat;
list-style:none;
}
#newsWrap a span {
display: none;
}
#newsWrap a:hover span{
display: block;
text-indent: 0;
vertical-align: top;
color: #000;
background-color: #fff;
font: normal 12px 굴림;
강호무림 9파·1방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있었던 청파문.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겠노라!’던 그 당당했던 청파문의 위세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니네는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어왔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경험이 발언되고 공유되고 풍부화되는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지식놀이터’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여성주의적 지식을 생산해나가고 있다. 다소 길지만, 이러한 실천에 대한 최이숙과 김수아의 평가를 인용해보자.
이렇게 오늘도 여름 안에서 놀았다. 시간이 휙휙 잘도 간다. 나는 소통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도 이제 고만 잊고 만나서 무얼 하면 즐거울까, 함께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되새긴다.
17살이면 국가에 불려가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해야 한다. 내가 자라서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이 이상한 제도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