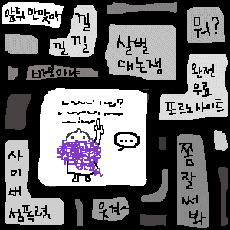
사이버 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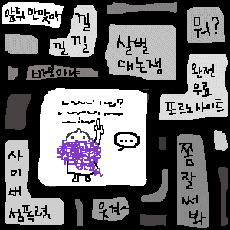 |
얼마 전 일명 ‘언니네 파티’에 다녀왔다. 나는 운 좋게도 ‘언니네’ (http://www.unninet.co.kr)가 여성주의 웹진으로 출발할 2000년도부터 회원이었고, 지금도 역시 ‘언니네’를 무지 좋아하는 회원이다. 파티는 ‘언니네’가 우여곡절 끝에 ‘유료화’를 결정한 후 3주년 기념도 할 겸 서로 힘주고 힘 받기도 할 겸 마련된 자리였는데, 파티 이름이 참 ‘딱’이었다 — ‘자기만의 방에서 시를 읊다’. (BGM으로는 이상은 6집의 ‘삼도천’이 어떨까?)
1463개의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의 유명한 작품 제목이다. [자기만의 방]을 처음 읽었던 5-6년 전에는, 읽으며 고개를 몇 번 끄덕이기는 했지만 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렸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글을 다시 꺼내 보았을 때는, 뭐랄까, 마치 심장이 그 순간부터 다시 뛰기 시작한 사람처럼 감동해서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건, ‘언니네’에 있는 ‘자기만의 방’의 글들을 읽다가 어떤 문장에 숨이 목이 탁, 메이는 순간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다.
눈치챘겠지만 ‘자기만의 방’은 ‘언니네’ 사이트에 있는 코너(?) 이름이기도 하다. 언니네 회원이면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분양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글을 올릴 공간과 자신이 관리 권한을 갖는 게시판을 갖는다. 말하자면 ‘자기만의 방’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해석하고 쓸 수 있는 사이버상의 작은 공간이다. 마우스 드래깅이 방지되어 있는 그곳에서 여성들이 쓴 글은 좀 덜 도둑맞고 덜 착취당하며, 관음증적 남성시선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을 수 있다. 그곳은 ‘자기만의 방’이므로, ‘객관’, ‘중립’, ‘합리’ 등의 추상적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드는 판단자의 시선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 ‘언니네’가 생긴지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자기만의 방’의 수는 1463개.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이 새로 쓰여지고, 읽혀지고, 그 중 어떤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잘 보이는 곳에 놓인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쓰여지는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동안 여성네티즌들이 뭔가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를 절로 실감하게 된다. 대체 그동안 어떻게들 참고 있었던 건지.
회상, ‘여자만세’에서의 전투
여기까지 쓰고 보니, 처음으로 ‘새롬 데이터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통신을 접했을 때가 생각난다. 아마도 97년인가 98년쯤이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발을 붙인 온라인 공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BBS ‘참세상’이었다. 컴퓨터에도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내가 ‘참세상’에 정을 붙일 수 있었던 건 그곳에 먼저 들어온 여성 이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자만세’라는 이름의 게시판 덕이었던 것 같다. 물론 그 곳 말고도 어디서건 토론은 할 수 있고, 자료도 올리고 내릴 수 있고, 소식을 전하거나 ‘일’을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 ‘정’을 붙이고 계속 사이버공간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정말로 ‘여자만세’ 게시판 덕이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쓰고 나누기 위한 게시판 하나를 지키고 가꾸기가 왜 그리도 어렵던지. ‘참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관계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랬다. 자주 남자들과 논쟁이 붙었고, 짜증과 피곤이 목구멍까지 차 오를 즈음에는 그 게시판조차 꼴도 보기가 싫어지곤 했다. 늘 남자들과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우지 않을 때에도 남자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며 글을 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랬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나는 ‘여성’이었고, 어딜 가나 남성시선·언어·논리·논쟁문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실감해 가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그것에 복종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적응’은 해야 했다. 그렇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대충 이런 거구나 정도로 익숙해졌을 무렵, ‘언니네’와 ‘자기만의 방’을 알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생각한다
‘자기만의 방’은 ‘언니네’의 혈관이다. ‘언니네’가 재정난에 부딪혀 사이트를 축소 개편하고 한동안 운영을 최소화했던 시기에도 계속 유지되고 풍부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여성 네티즌들이 물주고 벌레 잡아가며 가꾸고 있는 이 많은 ‘자기만의 방’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이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자기 언어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고 힘을 준다. 사실 이 한없이 넓은 사이버공간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찌 그리도 어려운지. 바로 그 이유로, 적어도 관음증적인 남성 시선에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사이버 성폭력의 위협을 덜 느끼며, 함부로 평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력을 지닐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매일같이 ‘자기만의 방’에서 나직나직하게, 그러나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이버 토론 문화가 그토록 폭력적이고 포르노 스팸메일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사이버 공간도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고 늘상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것은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난 그렇게 거대한 얘길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사이버공간에 사는 여성 네티즌들에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성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돈이 필요하다는 버지니아 울프의 주장처럼. 자, 오늘에야말로 그 동안 미루어왔던 ‘자기만의 방’을 나도 분양 받아야겠다. 1464번째 ‘자기만의 방’이 되겠지.
2003-08-03
